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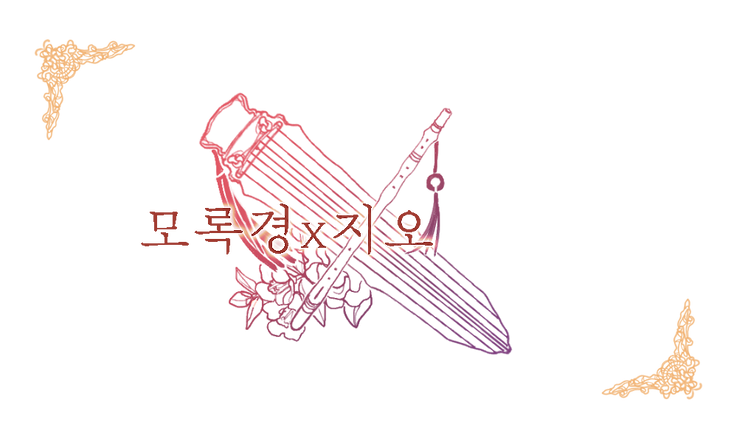
지오
@mmg0g

모록경
@GR33N__WH41L
-記憶의 痕迹-
위무선은 이파리를 두드리는 빗방울을 손으로 훑었다. 하늘은 맑지 않았다. 흐리다고도 할 수 없었으나 엷은 빗방울에 지나치게 꿉꿉한 기분은 위무선이 일주일을 빌었음에도 이 모양이다. 한 달을 내리 빌었어야 했나. 뒤늦은 후회를 그만큼 안았으나 변할 것은 없다. 성정에 그 기간을 끈질기게 버티는 것은 큰일임이 자명했고, 그 사실은 위무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던 것은 더욱이었다. 그렇지만 창틀을 무겁게 찰박이는 손짓이 못내 불만스러운 것은 이궁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무선에게는 그 나름대로 품고 있던 환상이 있었다. 꼽아보니 개중 절반도 채 이루지 못한 것에 위무선은 인생 헛살았음을 한숨으로 논했다. 지척에 다가온 것이 꿈같고 애매모호한 것은 어쩌면 그 환상에 부합하는 것을 찾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정답인지는 모호했으나, 중요한 것은 위무선이 믿기를 그랬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생사에 중요한 일이 지척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그 정도의 가벼운 생각이었다.
위무선 나름대로의 변명을 해 보자면, 아주 하릴없는 일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위무선은 무의식적으로 제 결혼식을 떠올리기를 그러했다. 위무선은 당신이 이십 세 전후에 동갑내기 여수사와 결혼할 줄 알았다. 이슬아침에, 연화오 같은 웅장하고 활기찬 호수 주변이면 더 좋고. 화후한 봄날씨 호수 위에 연꽃이 떠 있으면 더, 더 좋고. 제 앞에서 수줍은 듯 소매를 가리며 웃는 반려의 반붉은 면사포를 들춰 다감한 접문을 하고……. 그러니 위무선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아주 낭패였다. 그러니까, 콧노래가 날 정도로 기분이 괜찮다는 것에 더더욱.
이게 다 남잠 탓이야, 이 위아무개의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여놨어. 도려 된 자의 탓도 슬쩍 해 보고. 위무선은 자연스레 문 바깥에서 저를 기다릴 사람을 떠올렸다. 결혼식 전까지는 신랑, 신부는 얼굴을 마주하면 안 된다던데, 미신 따위는 가규에 없다는 듯이 새벽처럼 기척을 내는 남망기와 그를 당연히 여기는 위무선은 오십 보 백 보다. 곧장 문을 열어볼까 싶으면서도 문득 비죽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젠 신애함에도 이별을 걱정하던 시절마냥 애태우고 싶은 기분. 위무선은 익숙하게 백을 센다. 아니, 이백을 셀까? 역시 성미는 아니다. 눈 감고 부러 느리게 수를 세는 것은 남망기도 알고 있으리라. 그러니 이건 위무선의 농담도 못 되는 애교일 뿐이다.
애교는 오십을 넘고 칠십이 조금 안 될 때 즈음 멈추었다. 위무선이 멀어지는 기척을 느낀 뒤였으니 육십 오 정도, 위무선은 미련한 숫자 세기를 멈춘다. 설마 싶은 사태를 대비해 반붉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로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식전에 나오지 말라던 신신당부 치고는 복도를 지나며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기회를 놓칠 위무선은 아니었기에, 까치발에 정실건물을 살금살금 빠져나온다. 건물을 나와서는 대담해진 발걸음으로 남망기의 자락자취를 좇는다. 대문을 지나고 쪽문을 지나, 붉은 휘장을 건넜더니 얕은 호수에 다다랐다. 푸른빛이 너울너울 흐르는 가운데 붉은 것 하나가 위무선의 눈을 사로잡았다. 예쁘다, 눈꼬리를 살풋 접어 올리며, 위무선은 남망기에게로 달렸다. 분명 남망기가 저를 품에 올리는 순간 물에 빠져 혼례복이 젖을 테지만, 아무렴. 위무선의 품에 남망기가 들어찼고, 반붉은 면사포는 곧 농홍해졌고. 빗방울 소리보다 더 커다랗게 수면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잘박잘박. 졸지에 붉은 면사포를 둘러쓰고 동갑내기 사내에게 장가드는 신세가 되고도, 예복은 젖어서 살갗에 붙는 꼴이 되고도 불만이 잠드는 이유. 볼에 닿은, 식은 체온이 새삼 까슬하구나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그것도 네 흔적이구나.




